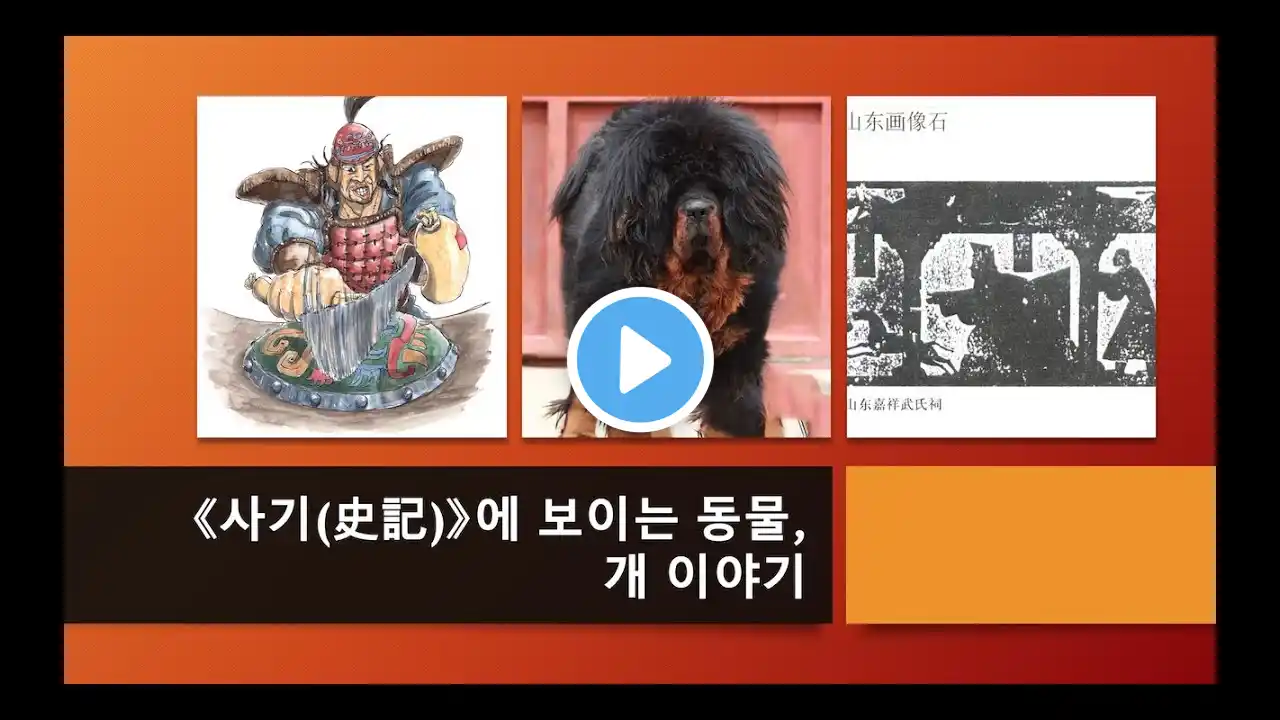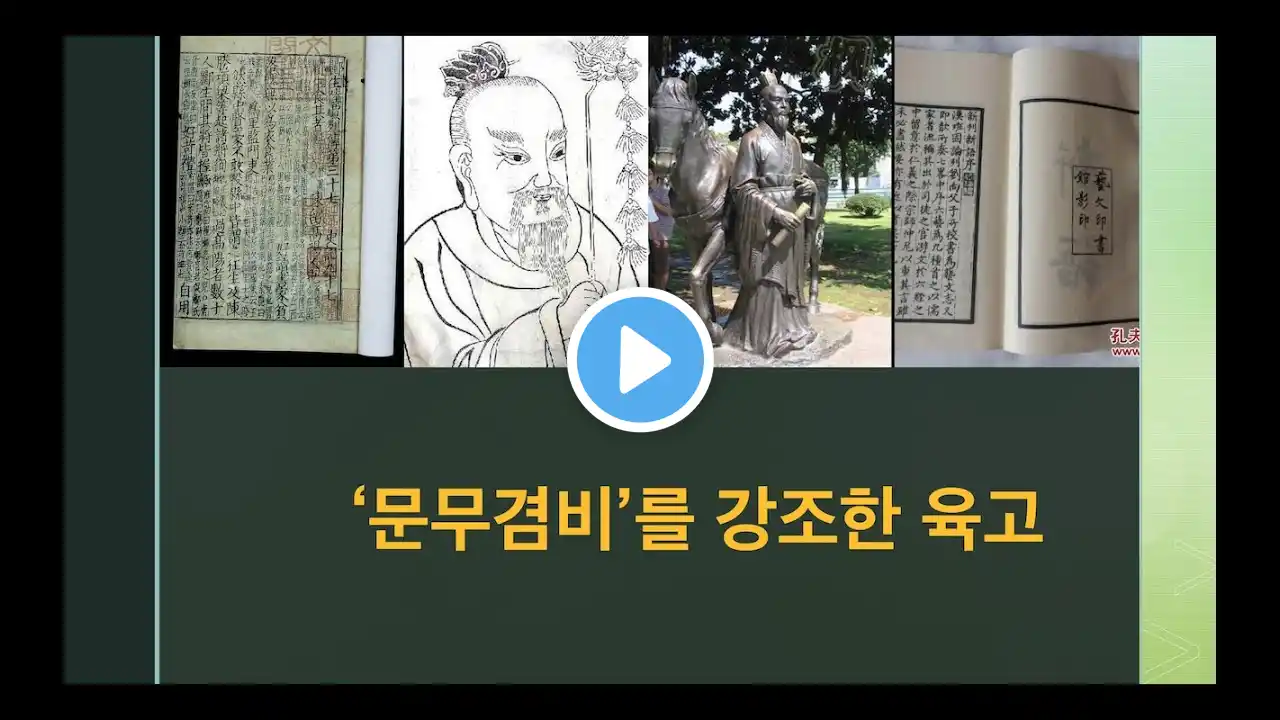사마천대학 : 『사기』 전문가 과정(제25강 '관포지교3-3')
관중 특집의 하나로 '관포지교'를 상세히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아울러 '관포지교' 고사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아래에 공유합니다 관포지교(管鮑之交) - ‘관중과 포숙의 우정’ 관중(管仲, ?~645 기원전)과 포숙(鮑叔)의 관계를 빗대어 친구간의 진한 우정을 가리킬 때 쓰는 성어이다 우정의 대명사라 할 정도로 널리 알려진 고사성어이다 제나라의 관중과 포숙은 어릴 때 늘 함께 놀던 친구였다 성장한 후 관중은 공자 규(糾)를 보좌했고, 포숙은 공자 소백(小白)을 보좌하게 되었다 두 공자는 왕위를 놓고 서로 싸워, 공자 규는 피살되고 그를 돕던 관중도 잡혔다 이 과정에서 관중은 공자 소백을 활로 쏘아 죽이려고 했고, 소백은 관중을 원수로 여겼다 그러나 포숙은 환공(桓公, 즉 소백)에게 관중을 재능을 소개하고 그를 재상으로 발탁할 것을 권했다 그 뒤 관중은 환공을 도와 제나라가 춘추시대 패자(覇者)가 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 관중은 포숙의 우정을 두고, “나를 낳아 주신 이는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 준 사람은 포숙아였다 ”라고 술회했다 ‘관중과 포숙의 우정’에 버금가는 우정을 나타내는 성어로 ‘문경지교(刎頸之交)’라는 것도 있다 참다운 우정처럼 아름다운 인간관계도 없지만, 어긋난 우정보다 더 추한 인간관계도 없다 우정을 소중하게 가꾸고 공을 들여야만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사랑의 절반은 노력이라는 말도 있듯이, 우정에도 세심한 배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관중에 대한 포숙의 배려는 가슴 찡하다 관중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일찍이 가난했을 적에 포숙과 함께 장사를 하였는데 이익을 나눌 때면 나는 몫을 더 많이 가지곤 하였으나 포숙은 나를 욕심쟁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내가 가난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그의 명성을 올리게 하기 위해 계획한 일이 도리어 그를 궁지로 몰아넣는 결과가 되었으나 그는 나를 어리석은 자로 취급하지 않았다 시운에 따라 이롭고 이롭지 않는 것이 있는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나는 몇 번이고 벼슬길에 나갔으나 그때마다 쫓겨나고 말았다 하나 그는 나를 무능하다고 하지 않았다 내가 시운을 타고 있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싸움터로 나갔을 때마다 도망쳐 왔으나 나를 겁쟁이로 취급하지 않았다 그는 내게 늙은 어머니가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자 규가 후계자 다툼에서 패했을 때 동료인 소홀은 싸움에서 죽고 나는 잡히어 욕된 몸이 되었는데 그는 나를 파렴치하다고 하지 않았다 내가 작은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공명을 천하에 알리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를 낳아 준 이는 부모이지만 나를 알아주는 이는 포숙이다 ” 사마천은 이들의 우정이 갖는 가치와 포숙의 양보를 높이 평가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관중의 현명함을 칭찬하기보다 오히려 포숙이 정확하게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밝은 것을 더 칭찬하였다 ”고 했다 포숙은 관중과 원수지간이나 마찬가지인 제나라 환공에게 관중을 추천했고, 자신은 기꺼이 관중 밑에서 일했다 관중의 보좌를 받은 환공은 춘추시대 패자(覇者)가 되었다 서로 사소한 결점을 인정하는 마음 없이 참다운 우정이 싹틀 수는 없는 법이다 옛날부터 참다운 우정을 나타내는 성어들이 많았다 생각나는 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포의지교(布衣之交) : 보통 백성들간에 이루어지는 친구와의 우정을 가리키는 말로, 이 성어 역시 [사기](‘염파인상여열전’)에 보인다 “신은 보잘 것 없는 백성들과 사귈 때도 속이는 일이 없었거늘 하물며 큰 나라야!” * 막역지교(莫逆之交) : 흔히 ‘막역한 사이’라고 말한다 서로 뜻이 통해 거슬리는 일이 없는 사이란 뜻이다 출전은 [장자](‘대종사’편)이다 * 저구지교(杵臼之交) : 절구공이와 절구의 관계라는 뜻으로 서로 없어서는 안될 절친한 친구 사이나, 절구공이와 절구 같이 보잘 것 없는 것이지만 이를 꺼리지 않고 친구를 사귈 때도 쓰는 성어다 출전은 [후한서] ‘오우전(吳祐傳)’이다 * 거립지교(車笠之交) : 한 사람은 수레를 타고 다니고 한 사람은 패랭이를 쓰고 다닐 정도로 차이가 나지만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절친하게 지내는 친구 사이를 일컬을 때는 성어다 [태평어람]이란 책에 인용된 주처(周處)의 [풍토기]에 보인다 * 망년지교(忘年之交) : 글자 뜻 그대로 나이를 초월한 깊은 우정이나 친구 사이를 가리키는 성어다 [남사(南史)] ‘하손전(何遜傳)’이 그 출전이다 * 총각지교(總角之交) : ‘총각’은 원래 위로 뻗친 어린아이의 머리카락 모양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 뒤로 습관적으로 어린 시절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우리말의 총각도 여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성어는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 사이를 가리킨다 ‘총각’이란 단어의 출전은 [시경](‘제풍齊風․포전甫田’)이며, [진서] ‘하소전(何邵傳)’에 ‘총각지호(總角之好)’란 표현이 보인다 * 죽마지교(竹馬之交) : 우리에겐 ‘죽마지우’나 ‘죽마고우’란 성어로 널리 알려져 있다 어릴 적 대나무로 만든 말을 타고 놀던 친구와 그 때의 우정을 가리키는 성어다 [후한서] ‘곽급전(郭伋傳)’과 당나라 때의 시인 두목(杜牧)의 ‘두추낭(杜秋娘)’이란 시에도 단편적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물과 물고기의 관계처럼 친밀한 우정이나 친구 사이를 나타내는 ‘수어지교(水魚之交)’([삼국지] ‘제갈량전’), 어렵고 가난할 때 함께 한 친구는 잊을 수 없고 조강지처는 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에서 나온 ‘가난할 때의 친구’라는 뜻의 ‘빈천지교(貧賤之交)’([후한서] ‘송홍전’ ; [남사] ‘유준전’)도 참다운 우정을 뜻하는 성어들이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친구를 ‘지우(知友)’라 하는데, 그보다 한 차원 높은 ‘지음(知音)’이라는 아주 고상한 표현도 있다 [출전 및 참고문헌] * [좌전] * [사기] 제62 관안열전 * [사마천 인간의 길을 묻다](김영수, 왕의 서재, 2010) * [인간의 길](김영수, 창해, 2018) #사마천대학 #관포지교 #관중_포숙 #우정 #좀_알자_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