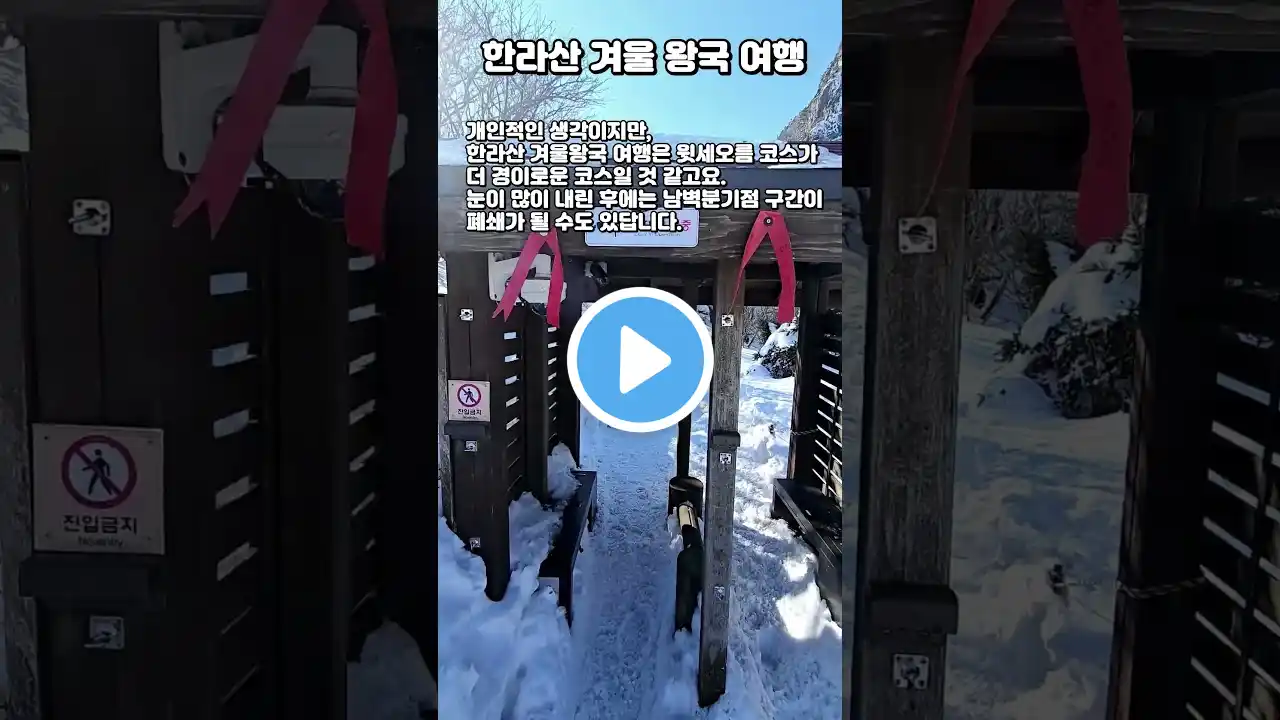한라산 백록담 '베일' 벗을까? 생성기원 찾아 수만년 시간 여행
6일 한라산 성판악 코스를 따라 3시간을 걸어 오르자 백록담이 눈 앞에 펼쳐졌다 다시 30분을 걸어 한라산의 상징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산정호수로 발길을 옮겼다 드넓은 호수 옆으로 연구원들이 쉴새없이 장비를 만지고 있었다 ‘쿵’ ‘쿵’ 거리는 소리와 함께 긴 파이프가 바닥 깊숙이 들어가더니 긴 모양의 퇴적층이 땅 밖으로 나왔다 수 만년의 시간동안 쌓이고 쌓인 한라산의 속살이 처음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다 시추기에서 나온 흙은 육안으로 보기에는 층의 차이가 있었다 지층의 중간에는 흙이 아닌 모래와 자갈이 쌓여 있었다 군데군데 나뭇잎도 눈에 띄었다 신비로움을 간직한 한라산 백록담에서 사상 처음으로 시추작업이 이뤄졌다 휴화산으로 알려진 한라산 분화구의 기원과 식생을 확인하기 위한 첫 시도이다 백록담은 남북 약 400m, 동서 600m, 둘레 1720m, 표고 1841 7m, 깊이 108m의 타원형 분화구이다 옛날 선인들이 이곳에서 흰사슴으로 담근 술을 마셨다고 해서 백록담(白鹿潭)이라 부른다 1960년대만 해도 백록담 분화구에 사람들이 모여 철쭉제를 열 만큼 개방된 곳이었다 1966년 천연기념물 제182호로 지정되고 1970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지형과 지질, 동·식물이 특이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어 자연의 보고(寶庫)로 불리지만, 지금껏 지형과 기후에 대한 정밀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1990년대 일본과 국내 학자들이 연대조사를 벌여 한라산의 나이를 2만4000년으로 추정한 것이 마지막이다 백록담의 마지막 화산 분출에 대해서도 기록조차 남아 있지 않다 이번 조사는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의 지형과 지질, 동식물, 기후 등 주요 영향인자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해 자연 보존을 위한 학술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사업비 3억8000만원을 들여 2016년 12월까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기초학술조사’를 진행중이다 조사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맡았다 이날 시추는 백록담의 정확한 나이를 밝히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연구원은 시추기를 동원해 백록담 바닥을 20~40m 뚫어 토양과 암석 시료를 채취하는데 집중했다 이를 위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헬기를 동원해 장비를 백록담까지 옮기는 수송작전이 벌어졌다 날씨 문제로 헬기 운항이 지연되는 등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연구원은 사상 첫 시추작업을 통해 한라산의 객관적인 화산 분출 시기를 밝혀낼 계획이다 그동안 2만5000년 전 생성된 것으로 알려진 백록담의 실제 나이가 밝혀지는 것이다 연대 측정과 꽃가루 시료 확인으로 제주의 옛 기후와 식생도 들여다본다 고지대 습지퇴적층을 조사하면 과거 기후와 대기 순환을 추적하고 동식물 분포도 추정할 수 있다 연구원은 사라오름과 물장오리, 소배록 등 한라산 내 산정화구호에 대해서도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해 연대별, 고도별 기수와 동식물 분포를 조사하기로 했다 시추와 함께 항공기에서 레이저를 쏘는 라이다(LiDAR) 촬영방식을 적용해 한라산 전체 지형과 지질도 기록으로 남긴다 3차원적 지형 모형은 장기적인 모니터링 자료로 활용된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안웅산 박사는 “기존 백록담의 나이는 1990년대 일본과 국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한 것”이라며 “최근 방식을 도입하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안 박사는 “이번 시추 작업으로 연대는 물론 퇴적층에 쌓인 식물을 분석하면 당시 기후도 유추가 가능하다”며 “퇴적층을 통한 연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 박사는 “백록담 바닥은 물론 송이가 쌓여 있는 동능과 서능에 대해서도 지질과 암석 조사를 병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백록담의 마지막 화산 불출 시기도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오는 10월쯤 시추작업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11월쯤 최종보고서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