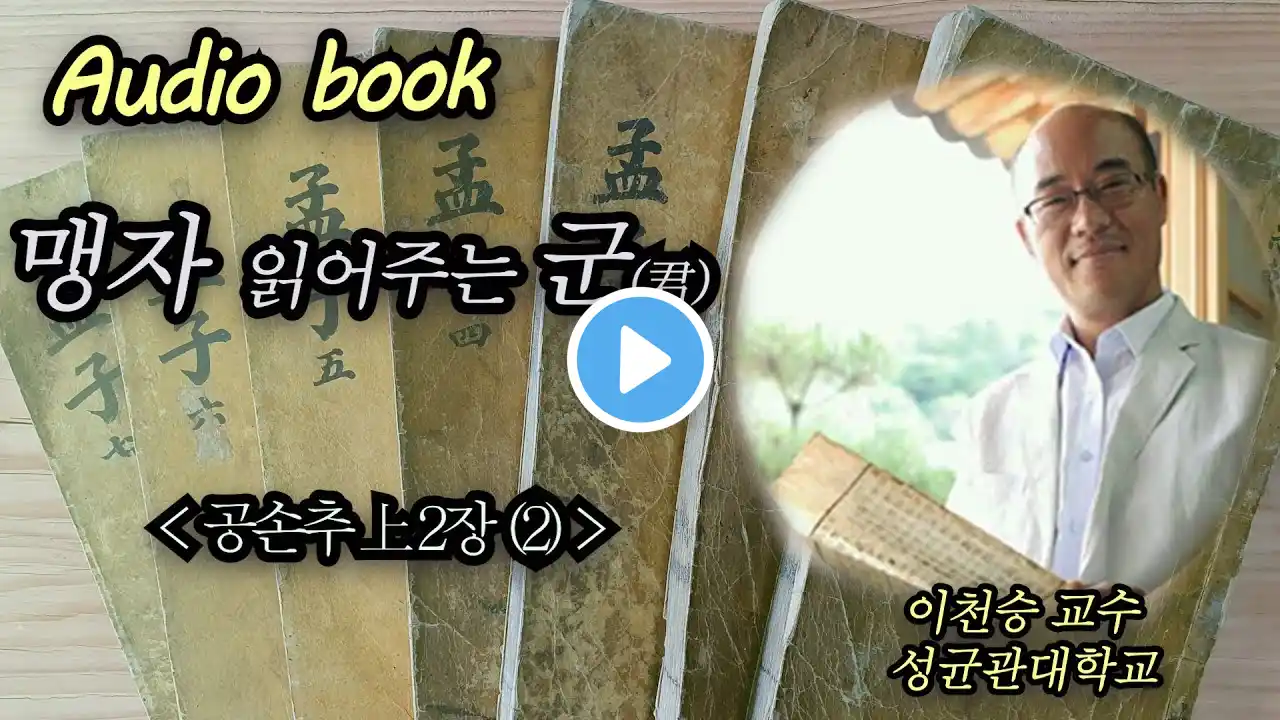(2-上-8) 「孟子(맹자)」 제2公孫丑(공손추上)편8장
孟子曰子路는 人이 告之以有過則喜하더라 禹는 聞善言則拜러시다 大舜은 有大焉하시니 善與人同하사 舍己從人하시며 樂取於人하여 以爲善이러시다 自耕稼陶漁로 以至爲帝히 無非取於人者러시다 取諸人以爲善이 是 與人爲善者也니 故로 君子는 莫大乎與人爲善이니라 ---------------------------------------- 與人爲善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선을 하다’는 곧 ‘다른 사람이 선을 하도록 도와주다’는 뜻 맹자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며 부끄러움이 되는 허물이 있으면 바로 고쳤던 성현 세 분을 들고서 군자의 가장 위대함은 다른 사람이 선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다 善은 거듭 설명했듯이 道를 잇는 것(一陰一陽之謂道, 繼之者善)으로, 하늘의 元德이 곧 善의 어른(善之長)이자 군자의 仁이다 그러므로 군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선을 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은 곧 어진 정치, 仁政을 베푸는 것이다 공자의 제자로 용감하면서도 정사에 능했던 子路는 안연(顔淵)과 더불어 스승의 ‘過則勿憚改(허물이 있으면 고침을 꺼려하지 말라)’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했던 인물이다 정사와 관련해 공자에게 물었을 때 “솔선수범하라(先之勞之), 게을리 하지 말라(無倦)”(『논어』 자로편 제1장)는 가르침대로 따랐기에 정사를 잘한 인물로 꼽힐 수 있었다 홍수를 다스려 五行大法인 洪範九疇(홍범구주)를 세우고 夏나라의 임금인 된 禹에 대해 맹자는 “聞善言則拜”라고 했는데, 『서경』 대우모(大禹謨)편과 고요모(皐陶謨)편에 근거한 것이다 대우모편을 보면, 우가 순임금의 명을 받들고 묘족을 치러 갔으나 끝내 정벌하지 못했을 때 益이 “오직 덕은 하늘을 감동시키는지라 멀어도 이르지 않음이 없나니, 가득차면 덜어냄을 부르고, 겸손하면 보탬을 받음이 이에 바로 하늘의 도입니다 순임금이 처음에 역산에서 밭에 나가시어 날마다 하늘과 부모에게 울부짖으시면서 홀로 죄를 짊어지시고 사특함을 이끌어서 일을 공경히 하여 고수를 뵙는데 두려워하듯 공경하고 조심하셨는데, 고수 또한 믿고 따랐으니 지극한 정성은 신을 감동시키는데 하물며 이 묘족입니까?(贊于禹曰惟德은 動天이라 無遠弗屆하나니 滿招損하고 謙受益이 時乃天道니이다 帝初于歷山에 往于田하여 日號泣于旻天과 于父母하사 負罪引慝하사 祗載見瞽瞍하시되 夔夔齊慄하신대 瞽亦允若하니 至諴은 感神이온 矧玆有苗아)”라고 했더니, “우임금이 아름다운 말에 절하고, ‘그렇도다 ’(禹拜昌言曰兪라)”라고 했다 고요모편에서는 고요(皐陶)가 “삼가 그 몸을 닦으며, 생각을 길이하며, 구족을 돈독히 펴며, 여러 밝은이가 힘써 도우면 가까움으로부터 가히 먼 곳이 이에 있나이다(愼厥身脩하며 思永하며 惇敍九族하며 庶明이 勵翼하면 邇可遠이 在玆하니이다)”라고 하자, 또한 “禹拜昌言曰兪라”고 했다 『서경』 의 昌言을 맹자는 善言으로 썼다 순임금은 大孝 大知함으로써 요임금에게 帝位를 물려받았는데, 益이 말한 것처럼 지극히 정성스러운 분이셨다 공자는 “순임금은 그 크게 지혜로운 분이시다 순임금이 묻기를 좋아하시고 가까운 말을ㅁ 살피기를 좋아하셨는데, 악함을 숨기고 선을 드날리셨으며, 그 양 끝을 잡아서 그 가운데를 백성에게 쓰셨으니 그 이에 순임금이로시다!(舜은 其大知也與신저 舜이 好問而好察邇言하시되 隱惡而揚善하시며 執其兩端하사 用其中於民하시니 其斯以爲舜乎신저 - 『中庸』 제6장)”라 했다 맹자가 순임금을 ‘與人爲善’이라고 한 것은 구체적으로 대우모편의 ‘負罪引慝’이고, 공자가 말씀하신 ‘隱惡而揚善’을 가리켜 말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