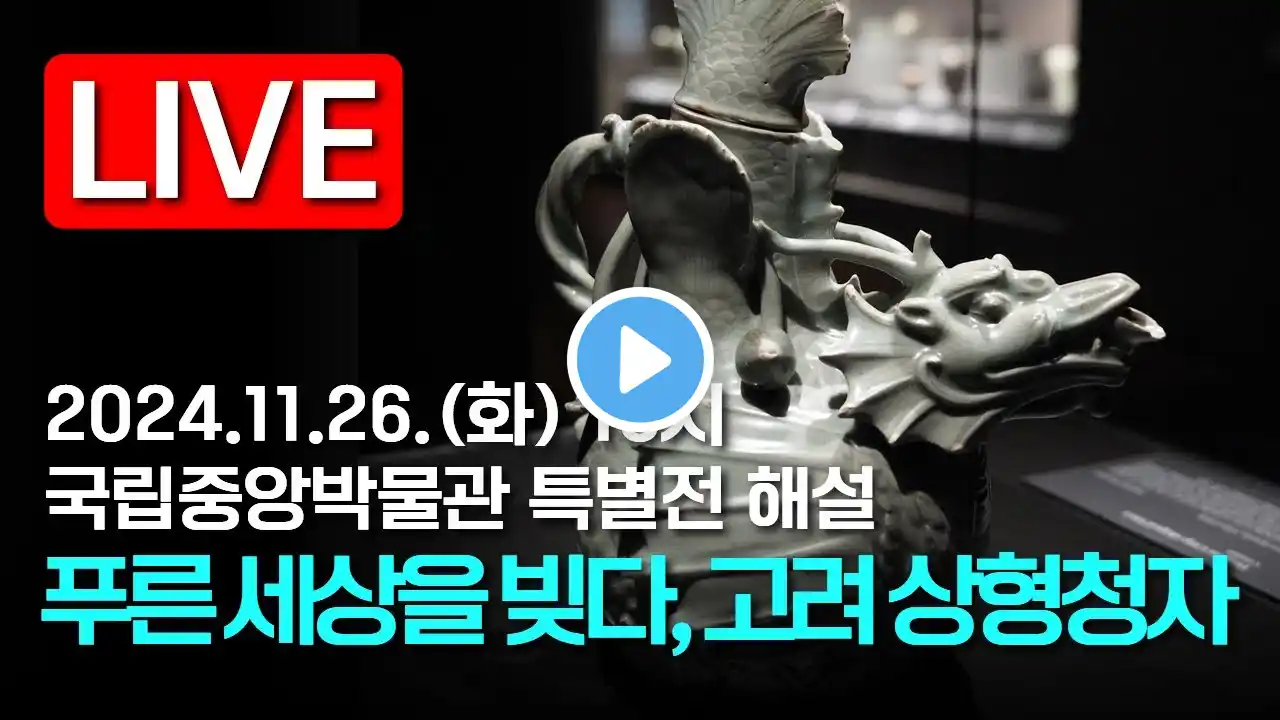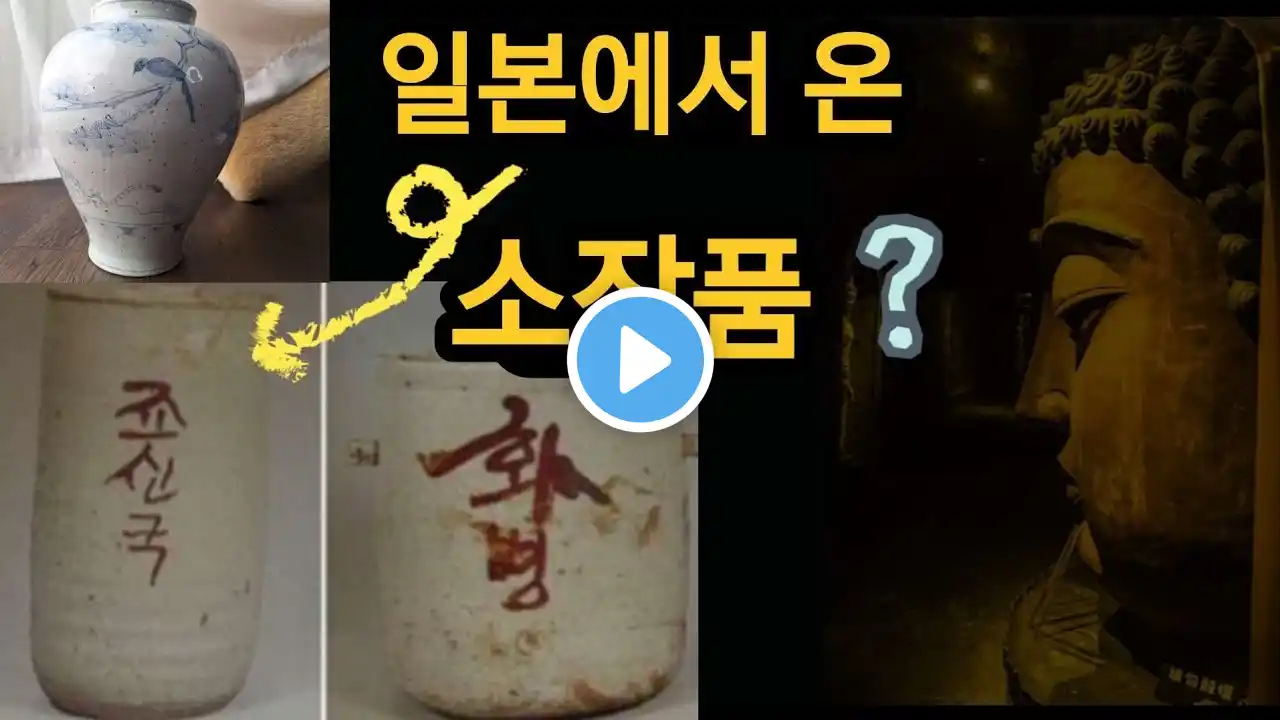![[Korean Cultural Tour] 부안청자박물관, 고려청자. 21세기 최첨단 기술도 구현 못한 고려청자 신비색, 부안청자박물관, 청자상감바둑판, 청자상감베개 도자기](https://poortechguy.com/image/imv5TTrfjTk.webp)
[Korean Cultural Tour] 부안청자박물관, 고려청자. 21세기 최첨단 기술도 구현 못한 고려청자 신비색, 부안청자박물관, 청자상감바둑판, 청자상감베개 도자기
부안청자박물관 부안의 고려시대 청자는 주로 12세기에서 13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문양이 없는 무문의 청자로부터 비색의 유약 아래에 섬세하고 세련된 음각문양이 새겨진 순청자, 화려한 듯 소박한 고려인의 정취가 담긴 구름과 학, 인물, 앵무새, 모란꽃, 연꽃, 물가에서 노니는 새 등의 풍경화 같은 문양이 베풀어진 상감청자, 그리고 이외에 개구리를 꼬옥 안고 있는 스님 모습의 연적, 깃털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듯 새겨진 오리형태의 연적 등은 사물의 사실감을 그대로 드러낸 상형 청자까지 온갖 종류의 청자가 다량으로 만들어졌다 고려청자는 부안의 유천리 지역과 진서리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청자가마터에서 제작되었으며, 현재 유천리 청자요지는 사적 69호, 진서리 청자요지는 사적 70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 사적으로 지정된 이후 1993년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 의해 이 두 지역의 요지에 대한 정밀한 지표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유천리에는 37개소, 진서리에는 40개소의 요지가 확인되었다 유천리·진서리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청자요지 가운데 시굴 또는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곳은 진서리 18호 요지·진서리 20호 요지·유천리 7구역 요지군 등 모두 3개소 7기의 가마가 조사되었으며, 이곳에서 출토된 다량의 청자유물은 부안지역의 고려청자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 밖에 유천리 12·13호 청자요지는 1960년대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약식으로 발굴조사 되었고, 일제강점기에 유출된 최고급 수준의 유천리 고려청자·백자 파편이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수장되어 있으며, 군산 비안도 앞바다에서 인양된 扶安産 청자가 국립해양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다 부안지역은 한국의 도자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곳이라 할 수 있으며, 세계에서도 문화재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고려시대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청자를 생산해냈던 곳이다 앞으로 부안지역의 청자와 가마터들을 더욱 잘 보존하고, 학술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함으로써 그 아름다운 비색의 전설이 영원하기를 염원해 본다 부안의 고려시대 청자는 주로 12세기에서 13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문양이 없는 무문의 청자로부터 비색의 유약 아래에 섬세하고 세련된 음각문양이 새겨진 순청자, 화려한 듯 소박한 고려인의 정취가 담긴 구름과 학, 인물, 앵무새, 모란꽃, 연꽃, 물가에서 노니는 새 등의 풍경화 같은 문양이 베풀어진 상감청자, 그리고 이외에 개구리를 꼬옥 안고 있는 스님 모습의 연적, 깃털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듯 새겨진 오리형태의 연적 등은 사물의 사실감을 그대로 드러낸 상형 청자까지 온갖 종류의 청자가 다량으로 만들어졌다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고려청자는 부안의 유천리 지역과 진서리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청자가마터에서 제작되었으며, 현재 유천리 청자요지는 사적 69호, 진서리 청자요지는 사적 70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 사적으로 지정된 이후 1993년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 의해 이 두 지역의 요지에 대한 정밀한 지표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유천리에는 37개소, 진서리에는 40개소의 요지가 확인되었다 유천리·진서리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청자요지 가운데 시굴 또는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곳은 진서리 18호 요지·진서리 20호 요지·유천리 7구역 요지군 등 모두 3개소 7기의 가마가 조사되었으며, 이곳에서 출토된 다량의 청자유물은 부안지역의 고려청자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 밖에 유천리 12·13호 청자요지는 1960년대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약식으로 발굴조사 되었고, 일제강점기에 유출된 최고급 수준의 유천리 고려청자·백자 파편이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수장되어 있으며, 군산 비안도 앞바다에서 인양된 扶安産 청자가 국립해양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다 부안지역은 한국의 도자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곳이라 할 수 있으며, 세계에서도 문화재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고려시대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청자를 생산해냈던 곳이다 앞으로 부안지역의 청자와 가마터들을 더욱 잘 보존하고, 학술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함으로써 그 아름다운 비색의 전설이 영원하기를 염원해 본다 12세기~13세기에 대단위로 窯場이 운영되던 곳으로 그 동안 全南 康津과 함께 高麗 中期의 대표적인 청자 요지군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부안지역의 청자는 품질에 따라 상품 청자는 왕실이나 귀족 등의 상위 계층에 공납이나 특수 주문용으로, 일부의 상·중품 청자는 관에 공납하였으며, 대량으로 생산된 중·하품의 청자는 민수용으로 공급되었을 것이다 부안지역의 도자문화는 줄포만 건너편에 자리하고 있는 고창 용계리·반암리에서 만을 넘어 부안 우동리와 진서리로 전파되었으며, 고려 중기에는 진서리·유천리에 대단위의 요장이 설치되어 다양한 품질의 청자를 제작해 내었다 그러나 부안지역에서는 고려시대의 청자뿐만 아니라 통일신라시대~고려시대의 도기, 조선시대의 분청자, 백자 등 전 시대에 걸쳐 우수한 품질의 도자기를 생산해 내었으며, 그 증거로 각 지에는 이와 관련된 가마터가 존재하고 있다 그 예를 살펴보면 부안군 보안면 신복리에는 통일신라시대~고려시대의 도기와 기와를 제작했던 가마터가 여러 기 존재하고 있으며, 보안면 우동리에는 고려시대 조질청자, 흑유자기, 도기 가마터, 그리고 조선시대 15세기 후반 경에 제작된 인화·음각·박지·귀얄기법으로 물고기, 국화, 모란꽃, 연꽃 등의 다양한 문양을 나타낸 분청자, 문양이 없는 백자 가마터 등이 조사된 바 있다 이외에도 부안지역에는 역사시대 도기, 조선시대 분청자, 백자, 기와, 옹기 등을 제작했던 가마터들이 도처에 존재하고 있어서 한국의 도자문화를 연구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부안지역에 이처럼 여러 시대에 걸쳐 다양한 도자문화가 꽃피울 수 있었던 이유는 사회·문화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지정학적 위치와 자연환경적 여건 등이 주요했으리라 판단된다 즉『고려사』에 의하면 당시 줄포만 지역 중에서 부안의 保安은 고려 초에 南道의 水軍에 설치한 12倉 중에 한 곳(安興倉)이었으며, 제안포(=柳浦, 현재 유천리로 추정됨)는 고려시대 漕運에 있어 중요한 거점이었음을 보여준다 또 진서리에는 ‘검모포진’이라 하여 군영을 두었으며, 고려~조선시대까지 수군의 요충지로서 입지를 점하고 있었다 특히 부안 변산 지역은 국가가 직접 그 생산과 공급을 관장하는 형태로 목재를 조달한 내용이 문헌에 나타나 있어 주목된다 즉 西材場이나 東材場은 궁궐 등 주요 건조물의 건설이나 수리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설치된 직영 목재 공급지였음에 틀림없다 변산 같은 곳이 그러한 곳의 하나였을 것이다 변산은 궁궐 등에 쓰일 목재를 공급하는 국가의「材府」로서, 1199년에는 이규보가 掌書記로 있을 때에 이곳에서 벌목을 감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변산에서 질 좋은 재목이 많이 생산되어 궁궐의 중수, 선박의 조성 등에 사용되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요업에 사용 가능한 땔감도 풍부하였음을 짐작케 해준다 그리고 제안포는 조운의 중요한 거점으로서, 완성된 자기제품을 해로를 통해 신속하게 수도 개경으로 운송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을 것이다 이 모든 요건들이 부안 지역에서 고려시대 이후 대단위로 요업단지가 조성되고, 활발한 생산 활동을 하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3세기 후반 경에 왜구와 몽고군의 침탈로 해안이 피폐화되고, 땔감 등의 자원 고갈로 인해 더 이상 가마가 운영되지 못하다가, 고려 말경에는 해안가인 줄포만을 떠나 인근의 정읍 등의 내륙으로 요장이 옮겨 갔다 따라서 13세기 말~14세기에 제작되는 말기 양식의 상감청자는 부안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정읍 지역에서 제작되어진다 이 시기 이후 15세기에 들어서면 부안을 비롯한 전북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조선시대 분청자와 백자가 제작된다 고려청자의 역사는 단순히 청자라는 유물에 의한 구분보다는 그것을 생산해 낸 가마의 구조와 함께 살펴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보여진다 현재까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고려청자는 발생 시기와 발생 장소, 발생 이유부터가 이견이 매우 많아 통일된 학설이 아닌 다양한 학설로 아직까지 연구되고 있다 이들의 학설 모두를 소개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간략하게 학설의 중심만 소개하고, 가마의 구조를 통해 고려청자의 변천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대표적인 가마터와 출토유물 등을 소개하겠다 청자의 발생설은 중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에 의한 발생설과 한반도 내에서 통일신라시대에 도기에서 자기로 자체 발생하였다는 설로 나눌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학자들은 중국 당말오대(唐末五代)에 오월국(吳越國)으로부터 기술이 전수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초기단계의 자기제작은 중국의 기술 집단이 직접 들어와서 가마를 짓고 그릇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한국에 기술만 전수했는지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현재까지 발굴된 자료 가운데 남한에서 가장 오래된 가마터는 시흥 방산동 요지인데, 『芳山大窯』발굴보고서에 따르면, 이 가마는 중국의 당·오대·송 시기에 양자강을 중심으로 한 화남지방의 전형적인 가마구조인 내화전(耐火塼 : 불에 잘 견디는 벽돌)으로 축조한 용요(龍窯)와 형태와 규모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의 기술도입 시기, 즉 언제부터 한국에서 청자가 제작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다시 여러 가지 주장으로 나누어진다 대표적인 학설로는 정양모 선생의 9세기 후반경, 윤용이·강경숙 선생의 918년이 있으며, 이 외에 북한의 김영진 선생도 황해남도 봉천군 원산리 2호 요지(최초요)를 9세기 후반으로 편년하고 있다 이들 학자들의 편년에 의하면 한국 자기의 발생은 크게 통일신라말~고려 건국 초로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근거가 될 만한 편년자료가 미약하여 몇 년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학자들의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조사된 고려자기 가마터들을 구조적 특징에 따라 단계를 나누어보면, 자기가 중국의 영향으로 발생한 초기단계·한국식 고려자기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중기단계·고려자기의 제작기술이 절정을 이루는 후기단계·고려자기가 쇠퇴하는 말기단계 등의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