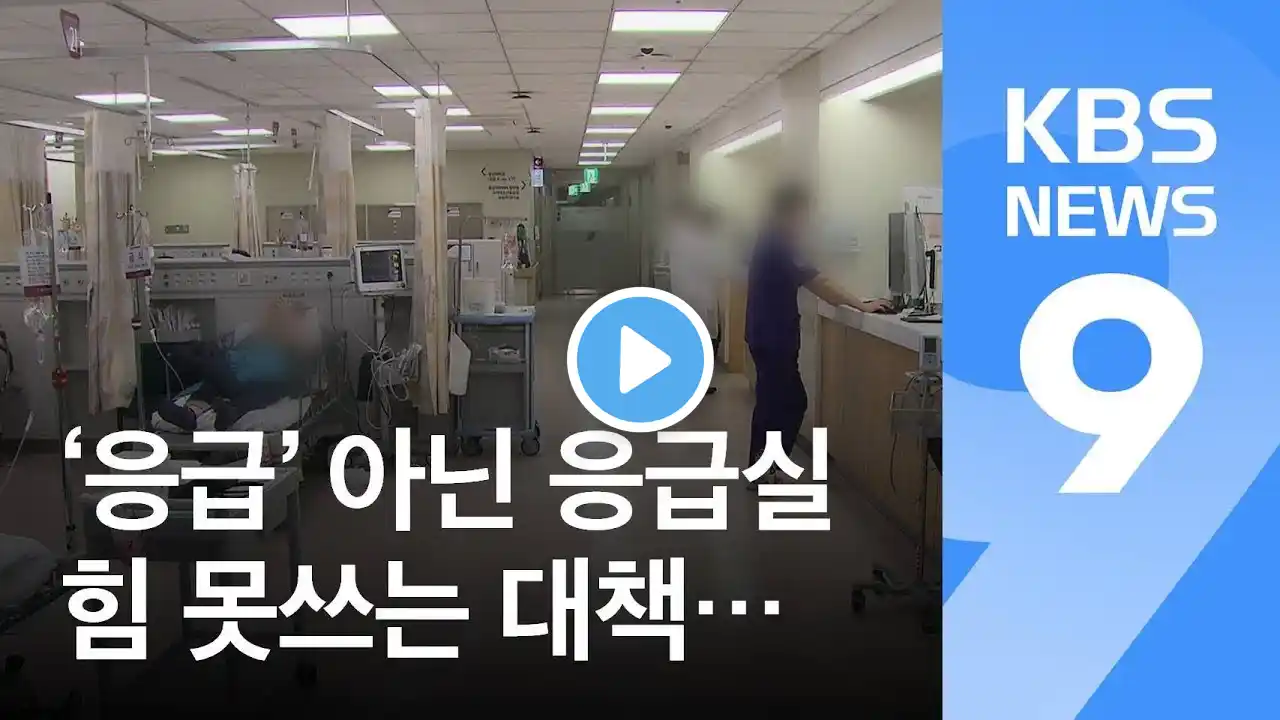‘6시간 룰’에 버티기까지…‘응급’ 아닌 응급실 / KBS뉴스(News)
고 윤한덕 센터장 순직의 여운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고인의 뜻이었던 응급의료체계 개선이 과제로 남는데요 환자들이 상태에 따라 적당한 병원으로 배치되면 좋겠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건지,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위급한 환자들 틈에 증상이 가벼워 보이는 환자들도 눈에 띕니다 [응급실 환자 보호자/음성변조 : "기운이 없어서 누워 계시길래, 지금은 못 걸어요 기운이 있을 때는 좀 걸어요 "] 지난달 이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절반가량이 준응급, 비응급에 해당하는 비교적 경증이었습니다 [윤영훈/고대구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 "경증 환자가 많이 오는 편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실손보험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응급실 문턱이 많이 낮아져서요 "] 갑자기 아프거나 다친 환자로선 어디로 얼마나 급히 가야 할지 모르니 웬만하면 큰 병원 응급실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엔 1339 전화로 의료인과 상담해가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119에 통합된 뒤부터는 그나마도 불가능합니다 [응급실 환자/음성변조 : "저 혼자 응급실로 왔어요 병원에 오면 안정이 되잖아요 집에 혼자 있으면 불안해 "] 응급실이 더 붐비는 건 이른바 '6시간 룰'도 한몫을 합니다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머물면 외래가 아닌 입원으로 분류해 진료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상태가 나아져도 응급실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의료인들은 애초 119 등이 환자를 옮길 때 긴급한 상황에서도 판단을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무조건 가깝거나 큰 병원의 응급실로만 이송하지 말고, 환자 상태에 따라 구분해야 위급한 환자들을 제때 제대로 처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윤/서울의대 의료관리학실 교수 :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 데려가는 게 임무가 아니잖아요 전원시키면 한 번 전원할 때 평균 세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럼 이미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거든요 "] 한 해 만 명 넘는 환자들이 구급차로 실려왔다가 응급실이 붐벼 접수도 못 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