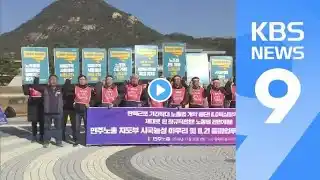![[경제 인사이드] ‘탄력근로제 확대’ 왜 논란인가? / KBS뉴스(News)](https://poortechguy.com/image/IHFTMwliY7E.webp)
[경제 인사이드] ‘탄력근로제 확대’ 왜 논란인가? / KBS뉴스(News)
정치권과 정부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계와의 입장 차이가 상당해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주 52시간제 무력화와 임금 감소 등을 이유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안진걸 실행위원과 함께 알아봅니다 탄력근로제, 일이 많을 땐 노동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을 땐 줄여서 평균 주 52시간을 맞추자는 겁니다 정부가 탄력근로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리려고 하면서 노동계와 부딪치고 있는데요 노동계에서 얘기하는 것이 탄력근로제 기간을 이렇게 늘린다면, 노동 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 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으냐는 거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현행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더라도 최대 1주 64시간까지 노동할 수 있는데,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상한제가 2020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므로 내년 말까지는 특정한 주의 최대 노동시간이 휴일노동시간 16시간을 포함하면 무려 80시간까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니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를 전혀 못 살리고 있는 것인데요 또, 그렇게 주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된 지 고작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확대 도입하겠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게 되고,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단위기간을 확대하게 되면 더 많은 기간 최대 한주 64시간에서 무려 80시간까지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64시간이면 주 5일 근무로 해도 1일 12 8시간이나 근무하게 되는 것이고, 휴일근무까지 포함한 80시간 근무도 주 7일 근무로 해도 1일 11 5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그렇게 일하고도 연장 근로 가산 수당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늘어날 테니, 더더욱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제도이죠 최소 2022년 이후 근로시간 52시간 상한제가 다 적용된 후에 현장의 부작용 등을 점검해 개선해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건강과 삶도 위협한다는 것도 하나죠? [답변] 우리나라가 하루 기준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고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 것은 그 이상의 노동은 신체에 무리가 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니까 그렇게 정한 것이죠 또 40시간을 넘어서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0 5배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규정을 만든 것 역시 가능한 한 연장근로를 하지 말라는 취지겠죠 고용노동부가 뇌 심혈관질환 직업병을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는 ‘과로’는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일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아래에서도 ‘과로사’가 가능한 정도까지 합법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죠 그 기간을 만약에 1년으로 확대하면 최대한 26주 동안 연속으로 최소 주 64시간에서, 주 80시간까지 합법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다는데, 이는 과로나 과로사를 용인하는 큰 잘못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녁이 있는 삶, 주말이 있는 삶 이야기가 나온 것이 10년이 훨씬 더 됐는데,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연간 노동시간이 1,300~1,700시간대인 선진국(OECD 평균은 2015년 기준 1,692시간)과 2,071시간인 한국에서 탄력근로제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면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든다는 주장을 노동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가요? [답변] 한국노총이 발표한 자료와 현재 법령에 근거해서 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할 경우 약 7%의 실질임금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노총이 자체 분석한 결과로는 시급 1만 원을 받는 노동자 김씨가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적용할 경우 이 기간에 78만 원 정도를 덜 받게 됩니다 시급 1만 원인 노동자가 주당 52시간까지 일할 경우 3개월 단위로 도입하면 39만 원의 임금손실이 발생하지만 6개월로 늘리면 78만 원, 12개월로 늘리면 156만 원이 깎이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급 1만 원을 받는 김씨가 6개월 탄력근로를 하면 3